신경숙 표절 논란과 문학권력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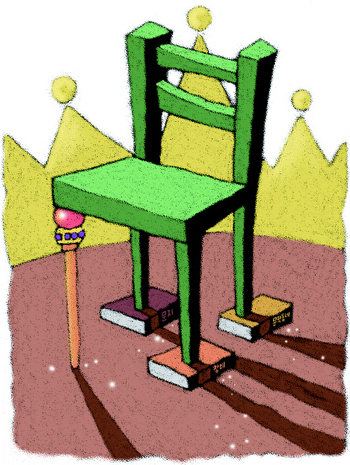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문학 출판시스템 고질적 문제 지적
출판사들, 이익·영향력 확대에 치중
작가 엄호하며 문제 덮기에 급급
소속 평론가 동원 ‘주례사 비평’ 쏟아내
비판자에 실질적 불이익 주기도
“잘 팔리는 작가 있다고 권력?” 반론도 사실 이런 식의 문학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9년 <한겨레> 지면에서 벌어진 신경숙 표절 공방에 문단이 거의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부터 문학권력에 관한 수상쩍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3대 문학 출판사의 영향력이 한층 강고해진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문학권력과 그 대표적 현상인 주례사비평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활발해져서 <주례사 비평을 넘어서> <한국 문학권력의 계보> 같은 기획 단행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주례사 비평을 넘어서>에 실린 김명인의 글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신경숙 소설 비평의 현황과 문제’는 신경숙이라는 작가가 문지, 창비, 문학동네의 비호 아래 ‘신화’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을 박혜경·임규찬·황종연 등 세 출판사 소속 평론가들의 평론을 토대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문학권력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국 문단을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집단이 있으며 이들이 작품 발표와 책 출간, 작품에 대한 평가, 문학상 운영 등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학권력은 강고한 카르텔을 이룬 채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침묵으로 대응하거나 더 나쁘게는 비판자에게 이런저런 불이익을 선사한다. 신경숙을 동인문학상 종신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조선일보>를 3대 문학 출판사와 함께 문학권력의 일부로 꼽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정한 문학작품이나 문학제도, 문학권력, 문학과 연관된 미디어를 비판했을 경우 원고청탁, 문단 인맥, 문학상 등의 실제적인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학평론가 권성우의 페이스북 글이 바로 그 점을 겨냥한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없지 않다. 문지에서 내는 계간지 <문학과사회>의 편집위원인 평론가 김형중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학이 지금처럼 위축된 상황에서 권력이라고 부를 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출판사가 잘 팔리는 작가를 거느리고 있다고 그것이 큰 권력인가. 이른바 주요 출판사들의 힘과 영향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것을 곧바로 문학권력이라 표현하는 것은 필요한 매개가 빠진 거친 논리로 보인다.” 평론가 황현산은 “‘권력’이니 ‘담합’이니보다는 한국 사회 특유의 ‘안면’과 ‘관계’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평론가 김진석 역시 “한국 문단에 여러 제도적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모두 문학권력으로 뭉뚱그려 얘기하기보다는 평론가든 작가든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학동네 편집위원인 권희철과 신형철이 신경숙의 표절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 그리고 창비 편집인 백낙청의 제자 오길영 충남대 교수가 페이스북 글에서 “(창비는) 백낙청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쓴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신경숙 표절 논란이 문지-창비-문학동네로 대표되는 ‘문학권력’의 내파(內破)와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