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갈등 상황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종종 있다. “그래, 법대로 해!”라는 말의 뉘앙스를 생각해보면, 법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공권력이라는 물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5월17일 새벽에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옥바라지골목에서 이루어진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보여준 것처럼, ‘법대로’의 종착점은 폭력이다.그런데도 그 법을 집행하는 이들은 법 뒤에 숨어 자신이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려고 한다. 관료들은 늘 스스로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이렇듯 공무원들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유체이탈이기 때문에 그들은 식민통치에도 봉사할 수 있었고 군부독재를 위해 일할 수도 있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이들이 있기에 식민통치도 군부독재도 존속이 가능했다. 군사적 점령이나 쿠데타와 같은 불법행위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체제의 유지 자체는 늘 ‘법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식민지배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민주화를 이루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뿐이다.주권이라는 것과 관련해 법학자들을 늘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헌권력의 패러독스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도 그 권력의 원천이 누구인지는 헌법 이후에 제정된 하위법에 의해 소급해서 규정된다는 패러독스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 ‘국민’이 누구인지 정한 법은 아직 없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어떤 존재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법 바깥에서 스스로 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에는 불법행위로 보이는 것이 새로운 법을 탄생시키는 것이며, 정치라고 불리는 행위는 바로 이런 것이다.강제집행이 있었던 날 옥바라지골목을 방문한 박원순 시장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거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은 많은 공무원들을 당황케 한 듯하다. 하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시장이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임을 보여주는 행위다. 법대로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치인은 필요 없다. 법대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정치는 존재하는 것이며, 관료들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이나 시장을 비롯한 여러 차원의 행정수반들을 선거로 뽑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행정은 늘 정치적이다. 하지만 ‘법대로’라는 말에 의해 늘 그 정치성은 가려진다.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도 자신의 공무집행 역시 정치적인 것이고, 하나의 가치판단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스스로의 행위가 정치적이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신이 법의 대행자일 뿐이라면, 무슨 책임감이 필요하겠는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판단에 따른 어떤 정치적 행위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책임의식은 생겨난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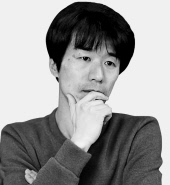 법대로 하자는 말이 대화의 종결을 선언하는 것과 달리,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정치는 긴장된 대화의 시작을 알린다. 민주주의는 여기서 시작된다.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법대로 하자는 말이 대화의 종결을 선언하는 것과 달리,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정치는 긴장된 대화의 시작을 알린다. 민주주의는 여기서 시작된다.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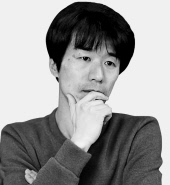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