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누르하치(奴兒哈赤, 1559~1626)의 모습. 애초 명의 지배 아래 있던 누르하치는 1583년 거병한 이래 주변 여진족들을 복속시키면서 명의 견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 명군이 조선에 참전하여 일본군과 싸우는 동안 그는 독립국가 후금의 건설 기반을 닦았고 나아가 제국 청의 기초를 놓았다. 요컨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모한 도발로 촉발된 임진왜란에서 그는 유일한 승자라고 할 수 있었다. |
[토요판] 한명기의 -420 임진왜란
27. 전쟁 이후의 조선과 동아시아 (마지막 회)
나라 안의 상처를 보듬기도 전주변 정세는 다시 격동했다
일본은 국교 재개를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재침하겠다고 협박하고
만주에선 누르하치의 세력이
후금을 세워 명과 조선을 위협했다 명은 고분고분한 조선을 이용해
후금을 제압하려는 유혹에 빠졌고
조선은 명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명청교체라는 현실을 보지 못했다
그 귀결이 1636년 병자호란이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왜와 이웃하고 있다. 임진년에 왜는 거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명나라를 침범하려 하니 길을 빌려달라’고 을러댔다. 선조께서는 의주까지 파천하여 명나라에 호소하여 병력을 청해 그들을 토벌하셨다. 하지만 팔도가 도탄에 빠지고 종묘가 잿더미가 되고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이 파헤쳐지는 망극한 변이 있었으니 저들은 우리와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이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 바다를 건너가 그들을 쳐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교린지국(交隣之國)으로 삼아 동래에 왜관(倭館)을 지어 예로써 접대하고 시장을 열어 교역하고 있다. 오호 통재라! 오호 통재라!” 조선 후기의 지식인 이성조(李聖肇, 1662~1739)의 글이다. 임진왜란을 일으켜 참혹한 피해를 끼친 일본에 대한 원한, 그럼에도 그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에게 복수하기는커녕 다시 이웃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조선의 무력한 현실에 대한 울분과 통탄이 절절하다. 쓰시마 사절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다 1598년 일본군이 물러가고 1600년 명군도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임진왜란은 끝났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다. 전쟁 기간 무수한 사람이 죽고, 다치고, 끌려갔다. 서울과 지방, 양반과 상놈을 막론하고 조선 팔도는 폐허로 변하고 사람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전쟁의 상흔을 씻어내는 것이 화급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그런데 임진왜란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도 겨를이 없던 당시 조선 주변의 정세는 다시 격동하고 있었다. 먼저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쓰시마(對馬島)는 왜란이 끝나자마자 조선에 사절을 줄줄이 보냈다. 1599년 가케하시 시치다유(梯七太夫) 등이, 1600년 유타니 야스케(柚谷彌介) 등이 와서 국교를 재개하고 무역을 다시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쓰시마가 침략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실에 격분했던 조선은 이들을 붙잡아 억류했다. 하지만 쓰시마는 집요했다. 1600년 쓰시마는 다시 사절을 보내 “새로 집권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임진왜란에 책임이 없다”며 막부의 입장을 전하고, 전쟁 당시 끌고 갔던 조선인 포로 160명과 명군 장수를 송환했다. 그러면서 조선이 계속 복교(復交) 요청을 거부하면 재침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조선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불공대천의 원수’와 국교를 재개하는 것은 너무도 치욕적인 것이었지만, 재침하겠다는 협박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고심 끝에 조선이 꺼내 든 것은 ‘명나라 카드’였다. 쓰시마 사절들에게 ‘왜란 이후 명이 조선의 외교를 좌우하기 때문에 조선은 복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응수했다. 1605년에는 부산에 머물던 쓰시마 사절들에게 “지금 평양 북쪽에는 명군 수만 명이 아직도 주둔하고 있다. 너희들이 재침하면 곧바로 달려 내려와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의 위세를 이용하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얕은수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쓰시마와 일본이 아니었다. 얼마 후 다시 나타난 쓰시마 사절들은 부산첨사 이경호(李景湖)에게 평안도 철산(鐵山) 부근에서 가져 온 이정표를 보여준다. ‘평양 북쪽에 명군이 아직 주둔하고 있다’는 조선의 호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정탐하기 위해 평안도에 밀정을 파견했던 쓰시마는 자신들이 직접 철산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정표를 들이밀었던 것이다. 이경호는 머쓱해질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조선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1607년 조선은 결국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다. ‘불공대천의 원수’를 다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과의 관계를 다독일 수밖에 없는 또다른 배경이 있었다. 그것은 임진왜란 이후 한층 더 불온해진 만주의 정세 때문이었다. 고분고분한 오랑캐, 박박 기어오르는 오랑캐 늑대가 사라지고 나니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했던가?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만주에서는 누르하치의 건주여진(建州女眞)이 굴기하고 있었다. 1583년 이래 주변의 여진족들을 야금야금 정복하여 명의 신경을 건드렸다. 1592년에는 왜란으로 조선이 위기에 처하자 ‘원병을 파견하여 일본군을 쓸어버리겠다’고 제안하여 위세를 과시했다. 명이 조선에 대군을 보내 일본과의 싸움에 몰두하면서 한눈을 팔자 누르하치의 세력은 더욱 커졌다. 1593년에는 누르하치에게 적대적이었던 여진과 몽골의 아홉 부족이 뭉친 연합군을 제압하더니 1603년에는 허투알라(赫圖阿喇: 오늘날 랴오닝성 新賓縣)에 흥경노성(興京老城)이라는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했다. 이후 건주여진의 세력은 일취월장하여 1616년 후금(後金)이라는 국가를 건설하고 1618년에는 정식으로 명에 선전포고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누르하치의 위협은 조선으로 밀려오기 시작했다. 1607년 누르하치는 두만강 부근까지 내려와 홀온(忽溫) 부족을 멸망시켰다.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홀온 부족이 무너지는 장면을 직접 목도하면서 조선은 바짝 긴장했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는 누르하치의 조선 침략이 임박했다는 풍문까지 돌고 있었다. 서북방으로부터 누르하치의 위협이 몰려오고 있던 상황에서 광해군은 1609년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다. 서북방과 동남방에서 동시에 적을 만들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조선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임진왜란 이후 명은 조선한테 이전보다 훨씬 버거운 존재가 되었다. 선조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조야 신료들이 “명의 원조 덕분에 망해가던 나라가 되살아났다”고 인식하면서 명군의 참전과 원조는 ‘나라를 다시 살려준 은혜[再造之恩]’로 숭앙되었다. 일부 신료들은 임진왜란을 아예 ‘재조’(再造)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선 내부에서 ‘명에 은혜를 입었으니 보답해야 한다’는 부채 의식이 높아가던 것과 맞물려 명의 조선에 대한 태도 또한 훨씬 고압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임진왜란을 ‘조선을 원조한 전역[東援之役]’이라 불렀다. 더욱이 임진왜란 이후 누르하치로부터 본격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자 명은 조선을 이용하여 누르하치를 견제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명의 관인들 가운데는 조선을 ‘순이’(順夷)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고분고분한 오랑캐’라는 뜻이다. 이제 ‘고분고분한 오랑캐’ 조선을 이용하여 ‘박박 기어오르는 오랑캐’ 후금(-청)을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 명의 깜냥이었다. 전형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외교술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이렇게 명청교체(明淸交替)라는 또다른 패권 교체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린다. ‘명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는 와중에 명청교체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 귀결이 1636년의 병자호란이었다. 어쩌면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병자호란의 조짐이 이미 싹트고 있었다고 해도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명은 결정적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더니 1644년 멸망한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 역시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 무너지고 도쿠가와 정권이 들어선다. 무모하고 허망한 히데요시의 침략전쟁을 계기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긴 주체는 단연 누르하치의 후금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명의 쇠퇴와 조선의 약세를 틈타 중원의 패자(覇者)가 되었다. 조선은 1592년부터 1636년까지 40년 남짓의 기간 동안 일본에 얻어맞고 명에 시달리고 청에 차이는 최악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다. 주목되는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모두 조선의 약체성을 지렛대로 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일본과 청은 ‘만만한’ 조선을 침략하여 그를 발판으로 명에 대한 공략에 나섰던 것이다. 그것은 이후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었다. 오늘의 현실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문제를 놓고 빚어진 논란에서 보이듯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은 한국을 여전히 군사적으로 ‘만만한 국가’로 묶어놓으려 하는 데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1만㎞ 이상을 날릴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고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 또한 수천㎞에 이른다. 중국의 선저우 9호가 우주 도킹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와중에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리기 위해 미국과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서글프다. 조총과 로켓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
|
아리랑 3호가 발사되는 모습. 지난 5월18일 한국의 세 번째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조총이 처음 들어왔던 다네가시마에서, 아리랑 3호가 일제 로켓에 실려 발사된 사실은 임진왜란 이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약체성 극복’이라는 과제의 중요성을 새삼 환기시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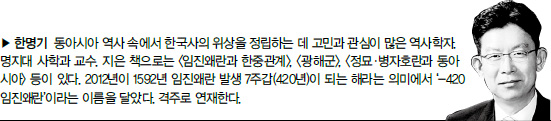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