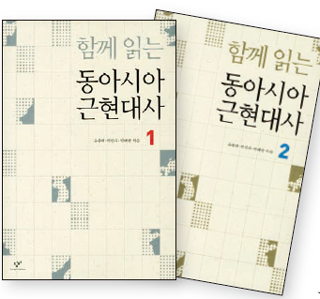|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 2 유용태·박진우·박태균 지음/창비·1만8000원 세학자들 6년간 토론하고 집필 한 주제 아래 각국 이야기 교차 | |
 |
 한승동 기자 한승동 기자 |
냉전 붕괴 뒤 유럽연합이 등장하면서 유럽엔 그때까지의 일국사 차원을 넘어 유럽을 하나의 지역단위로 바라보는 <유럽의 역사> 같은 공동의 역사책이 만들어졌다. 역사책은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일 수도 있고 변화를 가로막는 수구적 장애물일 수도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냉전 붕괴 뒤 ‘동아시아 공동의 집’ 구상과 같이 일국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한·중·일 3국의 학자·교사들이 모여 토론하고 공동 집필한 <미래를 여는 역사>(2005년) 같은 성과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예컨대 2006년에 중국에서 나온 <동아사>는 동아시아 역사를 아우르는 역사책인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고, 금세기 초반 일본에서 나온 <동아시아 근현대사>나 <동아시아 역사와 일본>처럼 동아시아 지역사를 표방한 책들도 각국사의 병렬적 나열에 머물거나 일본사만 부각시키는 자국사 중심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나마 현실은 더 열악해 보인다. 일본 우익 민족주의세력이 주도한 이른바 ‘자유주의 사관’에 입각한 ‘새 역사 교과서’류나 중국 ‘동북공정’류의 성찰 없는 자국중심주의적 역사와 이에 반발한 동일 차원의 각국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게 동아시아의 현실이 아닌가. 남북한 간의 대결적 역사관과 역사서술도 그 한 극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강점 중 하나는 일국사 서술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채용한 방법이다. 집필자들은 우선 다루는 시기를 해금 시기, 제국주의 시기, 냉전 시기, 탈냉전 시기 등 모두 넷으로 나누었다. 중국이 바다로의 진출을 금한 해금(海禁)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부터 서구 제국의 침탈기까지 동아시아에서 지속된 약 200년간의 평화로운 시기다. 집필자들은 17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이 시기를 모두 10개의 주제로 재분류한 뒤 시대순으로 배열하고 앞뒤에 서장과 종장을 따로 붙였다. 정치·경제 분야를 위주로 사회·문화 분야도 포함시킨 각 장은 다시 3개의 절로 나뉘고 각 절은 또 3개의 소항목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소항목 3개가 하나의 절을 이루고 3개의 절이 한 주제(장)로 묶이는 셈이다. 각 장의 3개의 절들은 예외도 있지만, 각각 지역 차원의 상호연관, 국가 차원의 비교, 그리고 민중 차원의 이야기가 차례로 서술되는 구조로 돼 있고 그 각각의 절을 200자 원고지 25장 안팎 분량의 소항목들이 채우는데, 이 책의 특징은 이 소항목들 서술부터 일국사가 아니라 다국사 또는 지역사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소재나 작은 주제를 한 나라의 얘기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다국 또는 지역 얘기가 교차하는 식으로 짜는 것이다. 집필 편의상 각 장들은 전공별로 나눠 한 사람이 대표집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의견과 자료 교환을 통해 집필자 모두의 생각이 담길 수 있도록 애썼다. 그때의 서술원칙이 ‘연관과 비교’다.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역사가 중심이지만 주제에 따라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나 인도까지도 ‘연관’되고 ‘비교’된다. 예컨대 필리핀에서 2차대전 뒤 독립과 계급해방을 위해 싸운 세력들이 미국의 제국주의적·냉전적 필요에 의해 제거당하고 우익보수 친미·친일세력이 주류로 등장하는 과정은 광복 뒤의 한국 현대사 과정과 흡사하다. 하지만 한국처럼 미완의 토지개혁조차 달성할 수 없었던 필리핀이 오늘날까지 대지주들이 지배하는 반봉건적 후진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비교점이다. 문인 사대부들이 권력기반을 이룬 중국·조선·베트남, 그리고 무사가 권력기반이 된 일본은 다른 근대의 길을 걸었다. 전후 일본 개조에서 재무장(역코스)으로 바꾼 미국의 대일정책 선회에는 인도의 간디 암살과 제3세계의 등장도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동아시아라는 ‘지역’ 안에서 ‘국가’ 및 ‘민중’(민간사회) 상호간의 의존·연관과 대립·갈등을 아울러 파악하도록 하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가는 노력을 부각시킨다”고 집필자들은 밝혔다. 지역·국가·민중의 교직이 서술 방법상의 원칙이라면 이 연대와 협력, 자유와 평등은 이 책을 관통하는 서술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선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붕괴된 지 20여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동아시아, 그 현실을 떠받치고 있는 정신구조, 진보를 가로막는 그 수구적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지은이들의 열망을 느낄 수 있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 ||||||||||||||||||||
'기사 및 퍼온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전 오디세이] 그리스 셋방살이 벗어나는 로마 문학의 팡파르 (0) | 2011.01.29 |
|---|---|
| 주역의 원리 (0) | 2011.01.29 |
| [김정운의 남자에게] 시간이 미쳤다! (0) | 2011.01.27 |
| 고전 오디세이 '전쟁이 만들 평화' 얼마나 갈 것 같은가? (0) | 2011.01.01 |
| '말발’만 센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0) | 2010.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