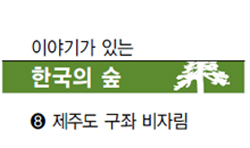|
자연이 낳은 ‘천년숲’…인간의 보살핌은 약일까 독일까
| |
| 등록 : 20110823 20:24 |
|
수백년 된 비자나무 2800그루
99년 숲가꾸기사업 지정 뒤 덩굴 제거하고 산책로 깔아 천연림 자취 감추고 조림숲화
숲을 잘 보전하려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적극 관리해야 하는가. 또 어쩔 수 없이 손을 댄다면 어디까지가 적당한 간섭일까. 제주에서 가장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아름다운 두 숲이 이런 고민에 싸여 있다. 천년 숲인 구좌 비자림과, 생긴 지 50년밖에 안 되는 한경면 저지오름 숲을 찾아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의 비자림에 들어서면 범상치 않은 기운이 엄습한다. 착생식물인 콩짜개덩굴이 푸른 비늘처럼 뒤덮은 회갈색 거목이 주목과 비슷한 바늘잎을 반짝이면서 늘어서 있다. 화산 분화로 생긴 토양인 ‘송이’를 깐 보행로의 붉은빛이 숲 바닥과 수피, 하늘까지 물들인 녹색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산간지대의 다랑쉬오름과 돛오름 사이에 긴 타원형으로 들어선 비자림은 면적 44만8000여㎡에 500~800년생 비자나무 2800여그루가 자리잡고 있다. 평지에 이렇게 나이 많은 나무들이 무더기로 들어선 곳은 여기밖에 없다. 최고령 나무는 900살에 육박한다. 두 번째는 2000년 ‘새 천년 나무’로 지정된 비자나무로 수령은 800살이 넘고, 굵기가 거의 네 아름에 이르러 이 숲에서 가장 웅장하다. 이런 터줏대감 덕분에 구좌 비자림은 ‘천년 숲’으로 불린다.
동행한 김찬수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박사가 비자나무 사이에 자귀나무, 팽나무, 비목나무 등이 모여 서 있는 곳을 가리켰다. “과거에 비자나무가 죽어 숲에 틈이 생기자 생겨난 선구종입니다. 숲이 계속 울창했다면 저절로 나지 못하는 나무이지요.” 비자림이 지난 수백, 수천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과거 이 비자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김 박사는 “1970년대 숲을 조사하다 길을 잃었던 적이 있다”며 “호랑이가 나올까 겁났을 정도로 으스스했다”고 말했다. 빽빽한 하층 식생과 덩굴로 원시 분위기를 물씬 풍기던 구좌 비자림은 1999년 숲 가꾸기 사업 대상이 된 이후 비자나무만 주로 보이는 숲이 됐다. 설명을 듣고 보니 비자림은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흔적이 역력했다. 비자나무를 덮던 덩굴식물과 다른 나무들은 상당 부분 제거됐고 가지치기, 수목치료, 지지대 설치 등으로 비자나무를 보호하고 있었다. 비자나무에는 나무마다 일련번호 팻말을 달아 관리하고 있다. 비자림 탄생의 비밀 하성현 제주도 비자림관리소장은 “숲을 가꾸지 않고 방치했으면 비자림은 모두 죽어 사라졌을 것”이라며 “송악, 줄사철, 등수국, 마삭줄 등 덩굴식물이 비자나무를 덮으면 광합성을 하지 못하거나 무게로 가지가 부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숲을 내버려 두면 빨리 자라는 후박나무와 아왜나무가 금세 뒤덮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논란은 구좌 비자림의 탄생 비밀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다른 비자림과 달리 구좌의 비자림에는 조림 기록이 없다. 천연림이라는 얘기다. 김찬수 박사는 “제사상에 올린 비자 씨앗을 뿌린 것이 숲이 됐다는 속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천연림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 1000m 이상 고지대에 비자나무가 자생하는데, 지형상 그 씨앗이 계곡물에 실려와 구좌에서 싹텄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연이 낳았다고 해도 기른 것은 사람이다. 비자는 구충제로 중요한 진상품이었기 때문에 비자림도 수백년 동안 철저히 보호받았다. 원론적으로 본다면, 비자나무숲을 내버려둔다고 비자나무가 모두 죽는 것은 아니다. 덩굴에 덮인 비자나무가 죽으면 덩굴도 죽고 숲은 새롭게 출발한다. 어린나무에서 죽어가는 나무까지 모두 있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숲의 모습이다. 그러나 구좌 비자림은 장기간 사람이 보살펴온 전통 마을숲에 가깝다. 면적도 그리 넓지 않아 자연의 손길에 내맡기기엔 불안하다. 김 박사도 “어느 정도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제주도는 비자림 관리에 연간 3억원을 들이고 있다. 덩굴을 제거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다. 걷기 열풍과 함께 올 들어만 12만명이 찾은 상황에서 나무를 보호하고 산책로를 늘리는 것이 현안일 뿐 숲의 장기적 미래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는 없어 보인다. 비자나무의 노령화를 대비해 후계목은 양묘장에서 따로 기르고 있다. 비자림 오른쪽 숲가꾸기를 덜한 곳에 가면 비자림의 과거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덩굴과 착생식물로 뒤엉킨 열대 정글과 흡사한 숲 군데군데에 비자나무가 서 있다. 바람직한 비자림의 미래는 아마 현재의 숲길과 이곳의 중간쯤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제주 구좌/글·사진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이 기획은 복권기금(산림청 녹색사업단 녹색자금)의 지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연 10만명 탐방 ‘저지오름 숲길’ 곰솔 병풍·낙엽 양탄자 ‘덩굴의 습격’을 어쩌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의 저지오름 숲길은 걷기 편한데다 자연성을 간직해 탐방객이 몰리고 있는 곳이다. 높이 239m의 봉우리로 제주도에서는 흔히 보는 오름이지만 숲길에 접어들면 전혀 딴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오름에는 등고선을 따라 두 개의 둘레길이 있다. 숲길 들머리의 현무암 계단을 올라 1.5㎞ 거리의 둘레길을 걸으면 오름의 아랫부분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돌아온다. 곰솔 낙엽이 깔려 푹신한 산책로 양쪽엔 담팔수, 자금우, 소태나무, 예덕나무, 보리수나무, 꾸지뽕나무 등의 난대식물이 자라고 있다. 송이를 깐 적갈색 보행로 옆의 고사리밭이 더욱 짙푸르다. 오름의 분화구에 오르면 다시 둘레길이 펼쳐진다. 이곳엔 난대림이 더욱 빽빽하게 우거져 숲 터널 밑으로 좁은 보행로가 나 있다. 둘레길에서 다시 나무 데크를 타고 내려가면 분화구 안의 전경을 볼 수 있다. 1950년대까지 무, 보리, 감자를 재배했던 분화구 안과 사면은 덩굴식물로 뒤덮여 원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서울의 자녀와 함께 숲길을 찾은 이정열(68)씨는 “걷기 편하고 자연을 잘 살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생명의 숲이 주관하는 2007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데 이어 최근 곶자왈을 품은 올레길과 연결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숲길에는 해마다 약 10만명의 탐방객이 찾는다. 숲길 조성을 주도한 주민 김태후(46·제주도 한라산연구소 직원)씨는 “어릴 때 오름 꼭대기에서 미끄럼 타는 놀이를 했을 정도로 나무가 없었다”며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든 방화선을 숲길로 되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숲의 관리는 난제이다. 송악, 상동나무, 청미래덩굴 등이 곰솔을 휘감아 죽이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른 손목 굵기의 송악에 감겨 고사한 곰솔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씨는 “한두 그루면 자연성을 위해 그대로 두겠지만 결국 일부는 제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지오름의 소나무숲은 언젠가 난대림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이 관리하는 숲길에서 곰솔과 덩굴식물의 공존은 쉽지 않은 실험이다. 제주 한경/조홍섭 기자
| |||||||||||||||||||||||||||||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화천 동촌마을 (0) | 2012.01.06 |
|---|---|
| 가을 사진 찍기 좋은 비경 '베스트 10' (0) | 2011.10.21 |
|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0) | 2011.06.30 |
| 전남 신안군 자은도 (0) | 2011.06.30 |
| 수도권 둘레길 (0) | 2011.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