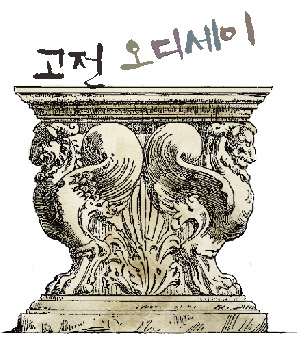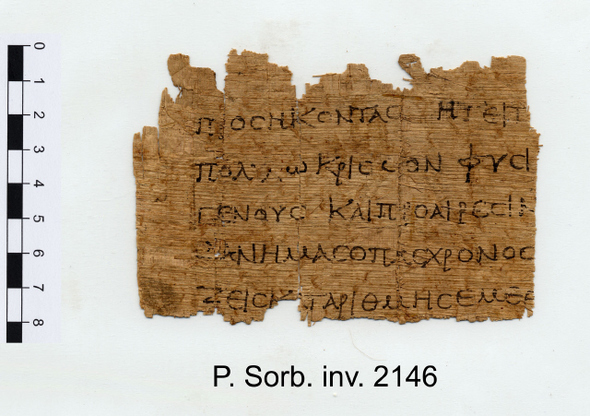| ‘이소크라테스’는 왜 철학자의 반열에서 제외됐나 | |
| 진정한 철학에 대한 반문 | |
 |
 고명섭 기자 고명섭 기자  |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변화무쌍한 현상을 넘어 영원불변한 본질을 지향했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달랐다. 그는 관념적인 지식에 대한 집착을 거부하고 생생한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레소피아’였다.
“소크라테스, 이소크라테스를 뭐라고 부를까요?” 파이드로스가 물었다. 소크라테스가 대답했다. “이소크라테스의 생각 속에는 본성적으로 어떤 철학(tis philosophia)이 깃들어 있어.” 플라톤이 쓴 <파이드로스>에 나오는 대화 내용이다.(278e-279a) 소크라테스는 군소리할 것도 없이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다. 그런 그가 인정했으니, 이소크라테스도 철학자의 반열에 서야 마땅하다. 하지만 서양 철학사를 다룬 책들 속에서 이소크라테스의 이름을 찾기란 쉽지 않다. 여러분에게도 낯선 이름일 듯. 이소크라테스 스스로가 일생을 철학에 바쳤다고 역설하는데도, 서양의 철학사가들은 그를 철학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도대체 철학이 뭐기에? 1955년 하이데거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는 철학으로 새겨진 낱말 필로소피아(philosophia)가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낱말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통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낱말의 쓰임새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꼴 자체가 잘 보여준다고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묻고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철학이었기 때문이란다. 이 질문이 찾는 ‘무엇’이란, 정의가 정의일 수 있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일 수 있는 원인과 본질을 가리킨다. 하이데거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철학적 탐구의 창시자로 소크라테스를 꼽았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다시 묻는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번에는 ‘~인가?’에 주목하자. 아, 현재시제다. 만약 이 현재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는 현재라면, 이 질문은 철학의 과거 모습이나 미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 철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 질문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철학이 변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의 전제, 더 나아가 변화의 철학, 생성의 존재론의 낌새를 읽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질문의 현재형은 시제를 초월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면, 그것은 현재형으로밖에는 표현될 수 없다. 이런 현재형은 과거와 미래의 틈새에 끼어 있는 순식간의 찰나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의 금을 지우고, 흘러가는 모든 순간들에 현재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 질문은 시간의 흐름 전체를 넘어서는 연속성, 영원불변하는 초월성을 노린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철학이 이런저런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변화의 겉모습 너머에는 철학을 철학이게 하는 그 ‘무엇’, 철학의 진짜 모습(idea)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으며,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파르메니데스의 전제와 플라톤의 본질주의적 형이상학과 존재의 철학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선, ‘철학이란 무엇이었는가?’라고 질문을 바꾸어 답을 찾는 것이 더 좋다. 철학을 철학이게 하는 영원불변하는 본질과 참모습이 있다면, 먼저 과거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어 현재의 상태를 정당화할 수 있고, 반대로 철학이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변한다면, 철학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철학의 변화와 다양성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학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그 말이 태어났던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기엔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소크라테스는 물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둠지어 있다. 그들에게 철학이 지향하는 지혜란, 변화무쌍한 현상을 넘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 한결같은 참모습에 대한 지식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풍경을 좀더 넓은 눈으로 둘러볼 때, 이와 같은 의미로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라인이 견지하던 하나의 의견이었을 뿐임을 알게 된다. 특히 지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철학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변하지 않는 본질 따위는 없고, 그것의 참모습에 대한 지식은 공허한 망상일 뿐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통하며 합의될 수 있는 의견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 의미 있는 것이라면,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허황된 것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의혹을 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소크라테스 라인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소크라테스의 목소리다. “지혜와 철학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만 하며, 무엇을 말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식(episteme) 따위도 인간의 본성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sophos)이란 시의적절한 의견(doxa)들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더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며, 그와 같은 분별력을 민첩하게 취하는 능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입니다.”(<안티도시스> 270-1) 이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를 겨냥하는 것 같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통해 추구하던 지식에 우리 인간은 도달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과감하게 던져버렸다. 영원불변하는 보편적인 지식은 급변하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 쓸모가 없다는 뜻이겠다. 반면 그는 소크라테스가 참되지 않다고 폄하하던 한갓된 의견을 오히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유용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끌어올렸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에 대한 집착을 거부하고 생생한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태도라고나 할까? 그는 참된 지혜란, 영원불변하는 본질을 아는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변화무쌍하며 다양한 가치관이 어우러진 삶 속에서 좋은 의견을 시의(kairos)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는 분별력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철학, 곧 지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원활한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낼 줄 아는 사람을 수사적 인간(rhetorikos)이라고 하였다. 이소크라테스에게는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였다.
김헌/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레소피아(rhesophia): 레(rhe-)는 공식 석상에서 청중들에게 연설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레토르(rhetor)는 연설가를 뜻하며, 레토리케(rhetorike)는 설득력 있는 연설을 할 줄 아는 능력과 기술을 뜻한다. 흔히 수사학으로 번역되는 레토릭(rhetoric)은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레소피아라고 하면, 지혜(sophia)가 담긴 말을 설득력 있게 펼친다(rhe-)는 뜻을 가질 수 있기에, 이소크라테스가 지향하던 교육의 이념과 잘 맞을 것 같아 새롭게 만들어 보았다. 우리말로 뭐라 해야 할지는 고민중이다. | ||||||||||||||||||||||||||||||||||||||
'기사 및 퍼온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이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주세요” (0) | 2010.11.08 |
|---|---|
| 고전 에세이 아리스토파네스 (0) | 2010.11.06 |
| [한홍규-서해성의 직설] "이태백 콤플렉스 드디어 사라졌어" (1) | 2010.10.15 |
| 히로히토는 신권군주이자 전쟁 지도자 (0) | 2010.10.09 |
| 고전 오디세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들... 품을까 보낼까 (0) | 2010.10.09 |